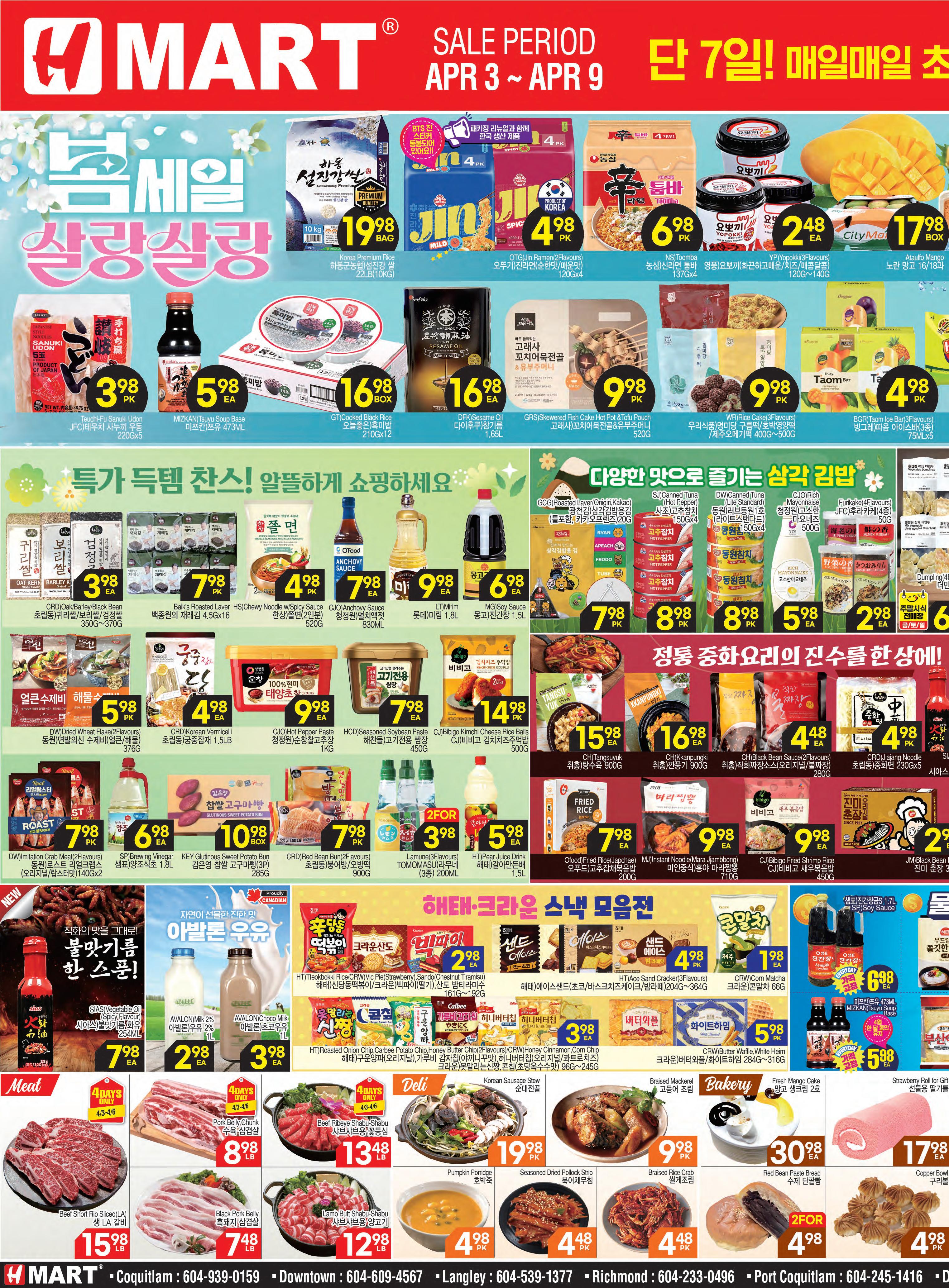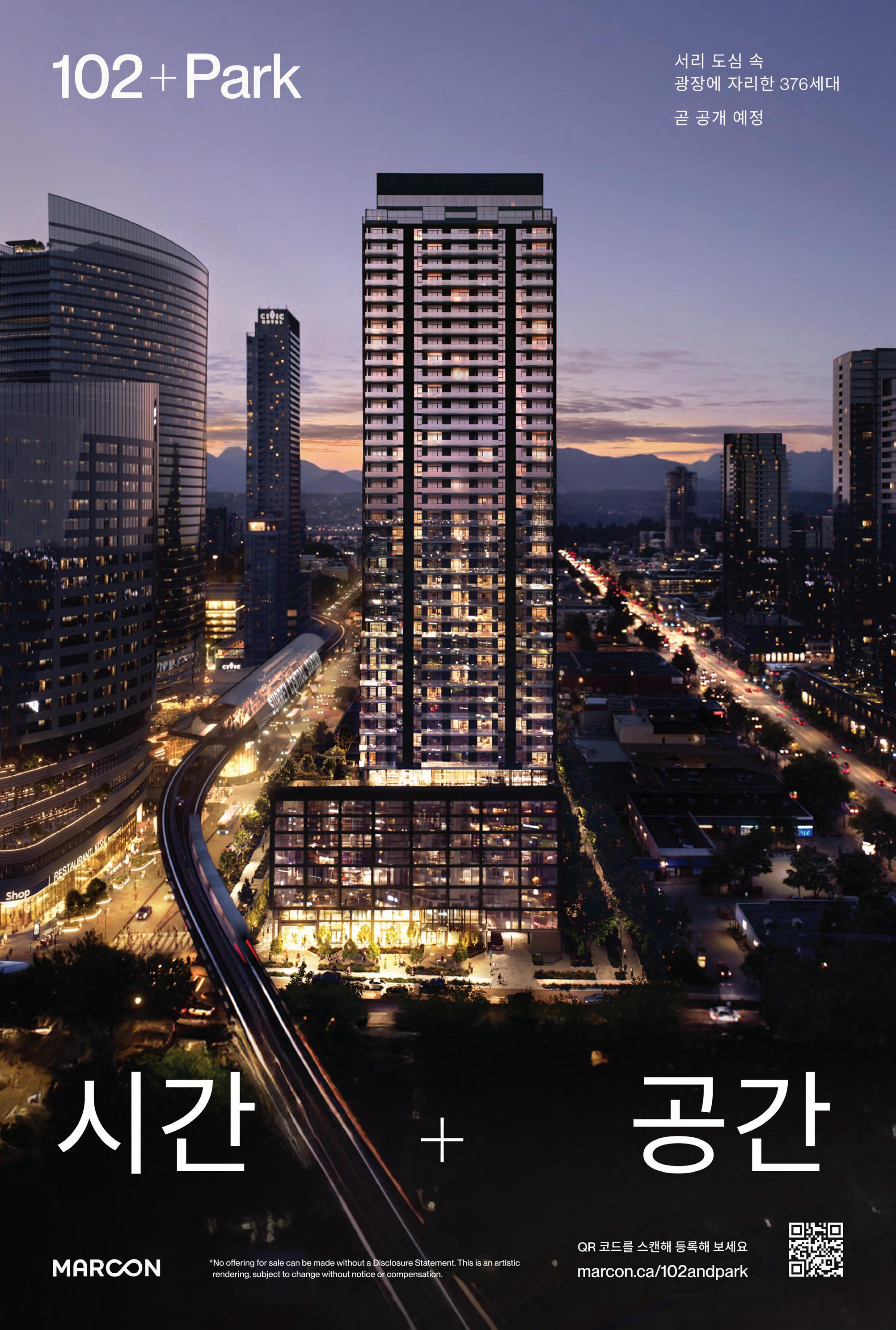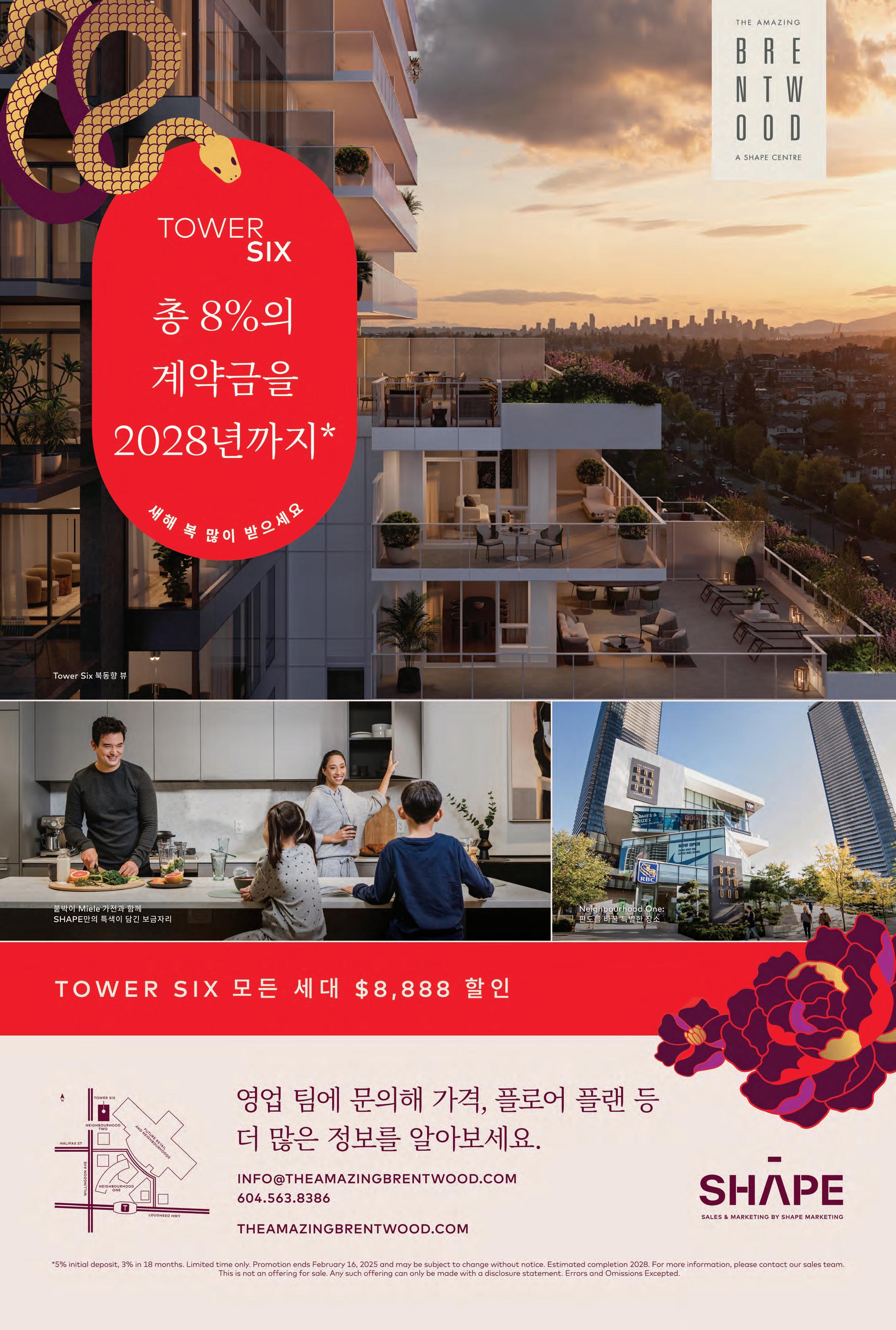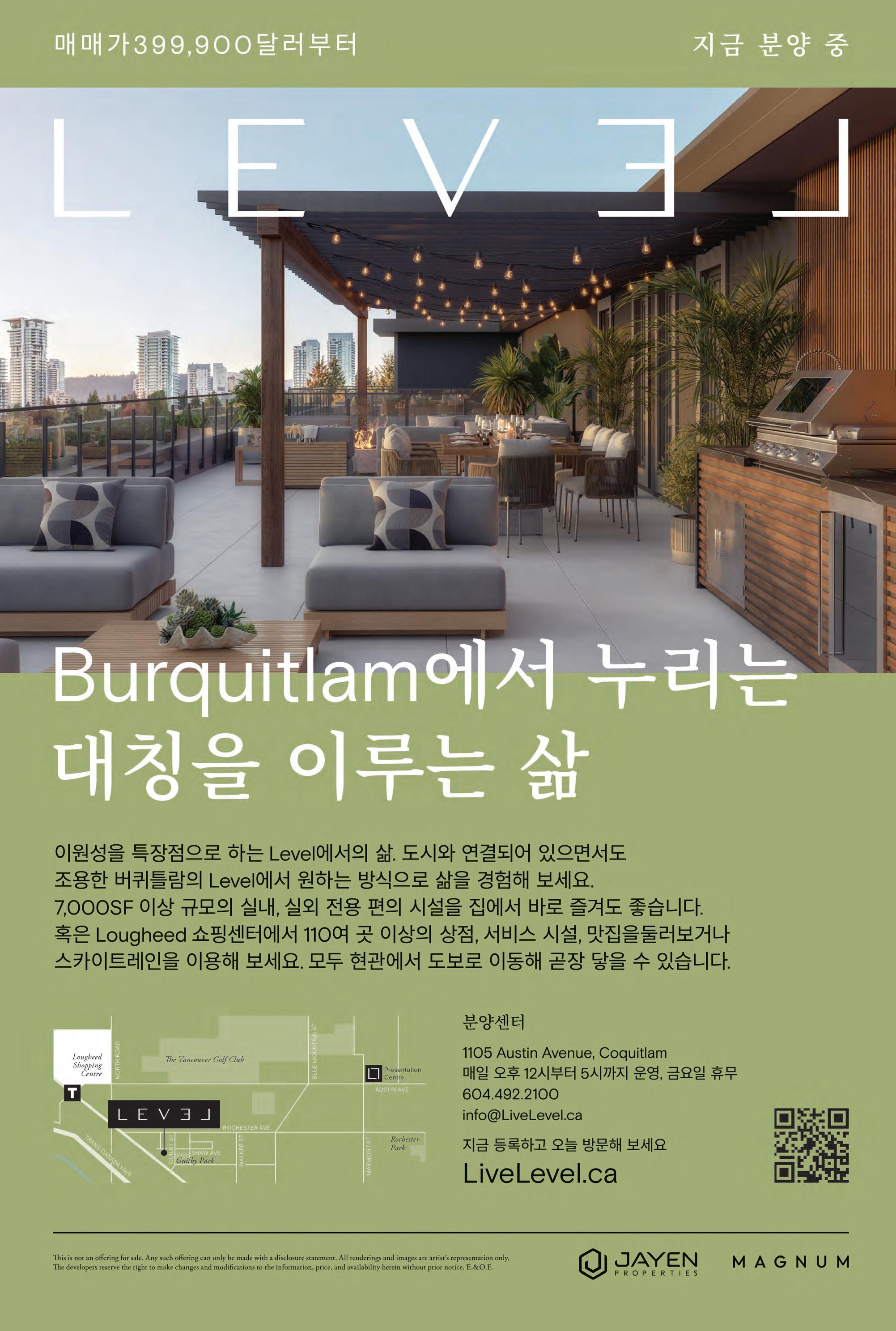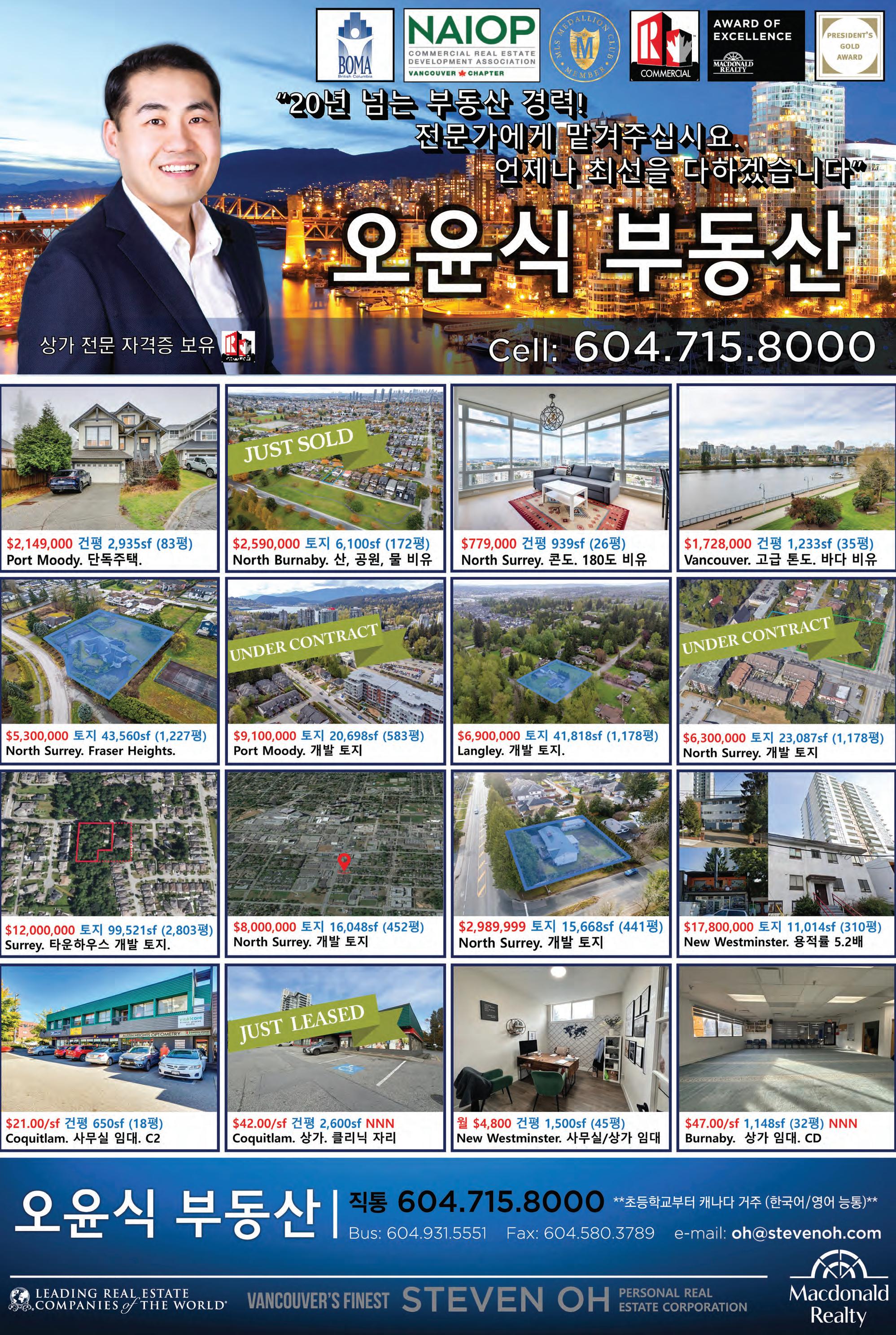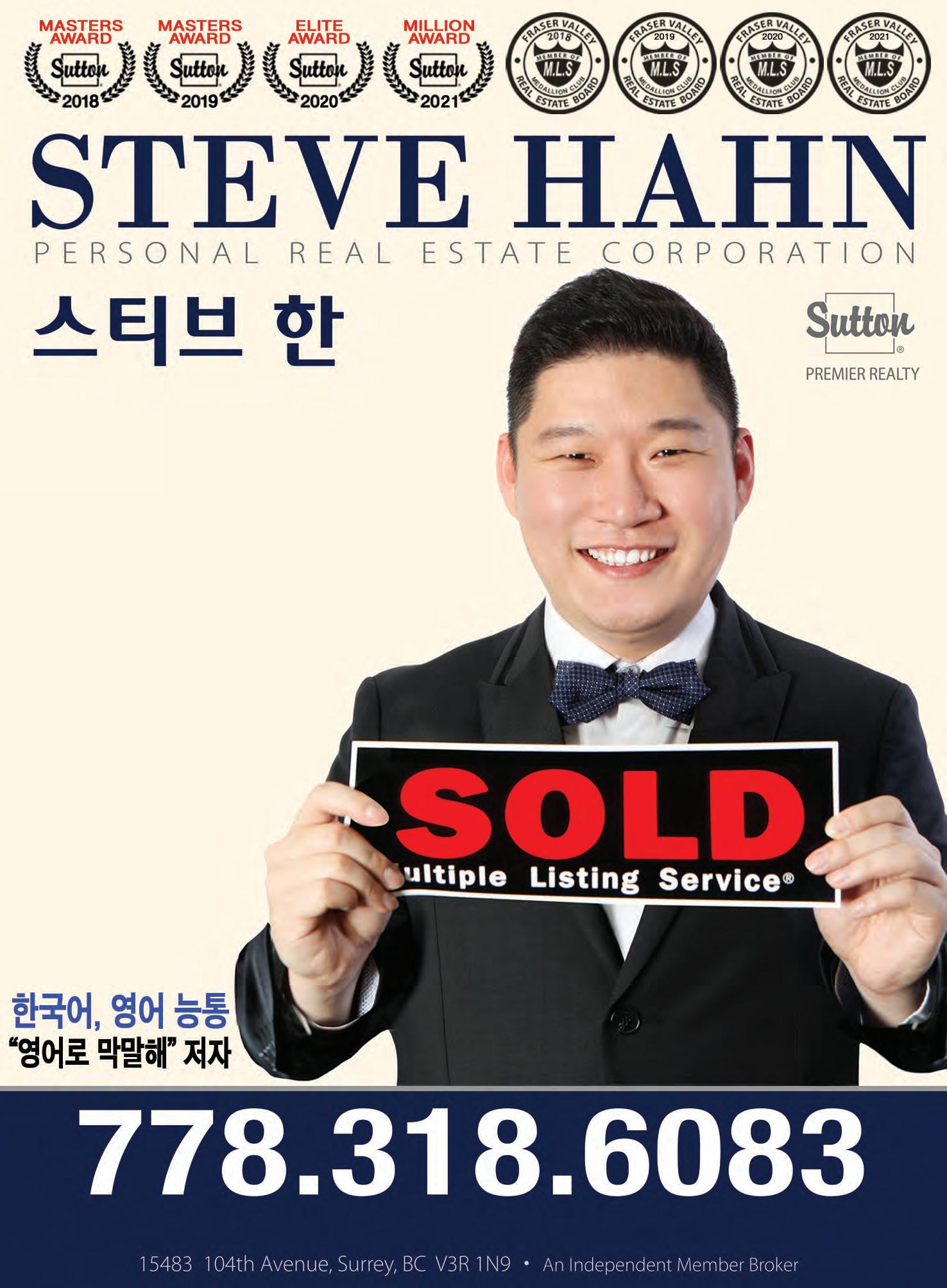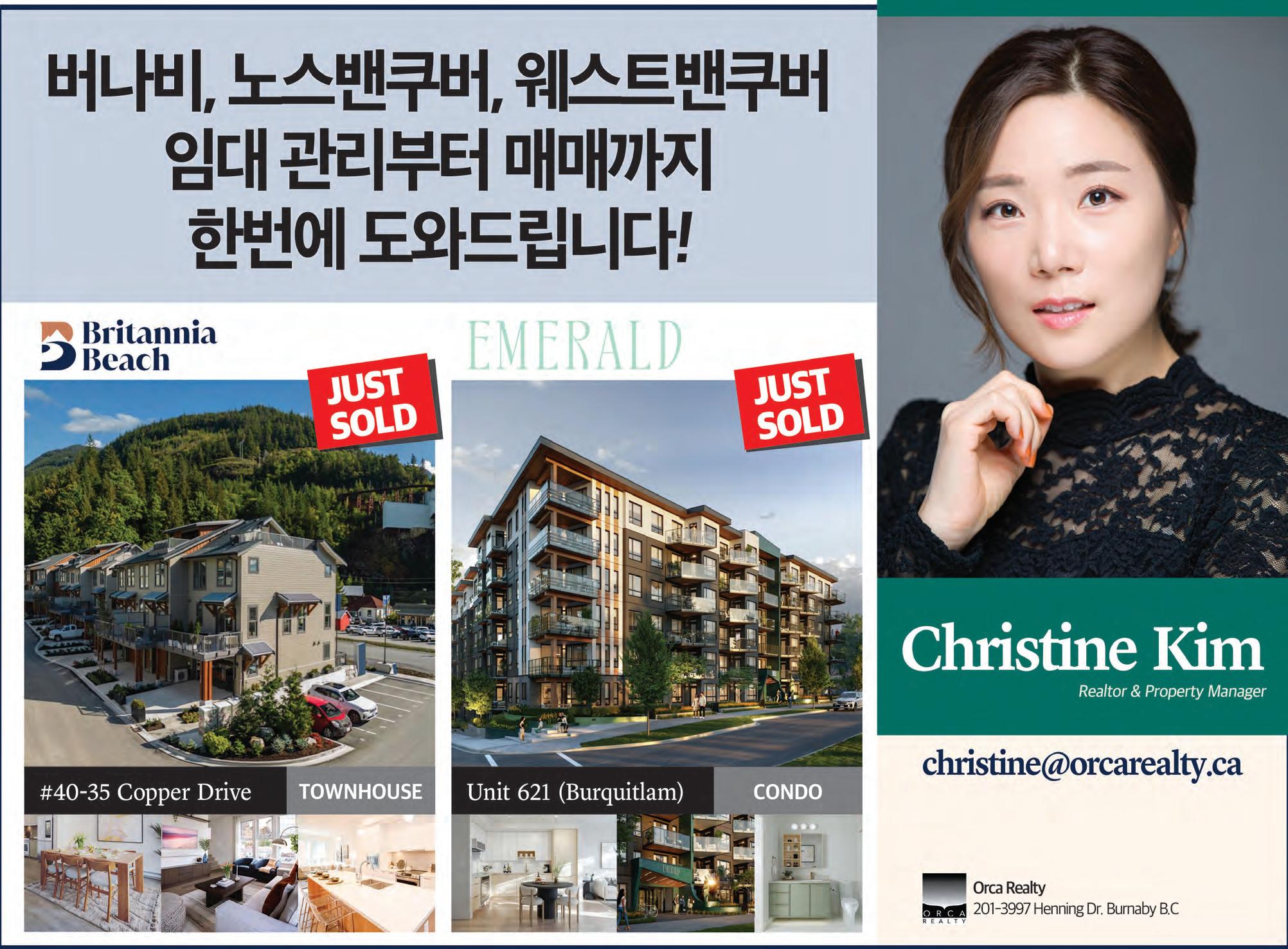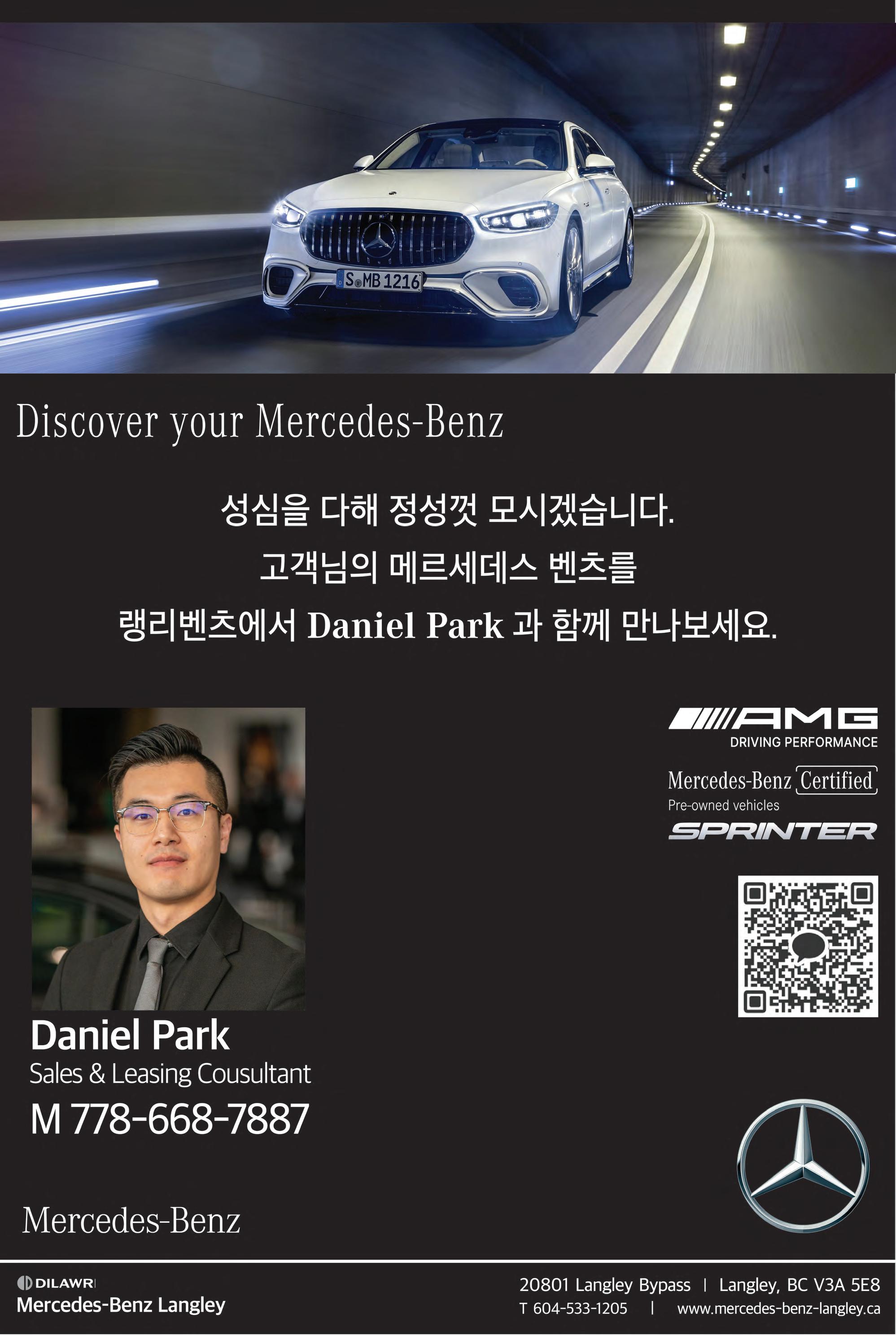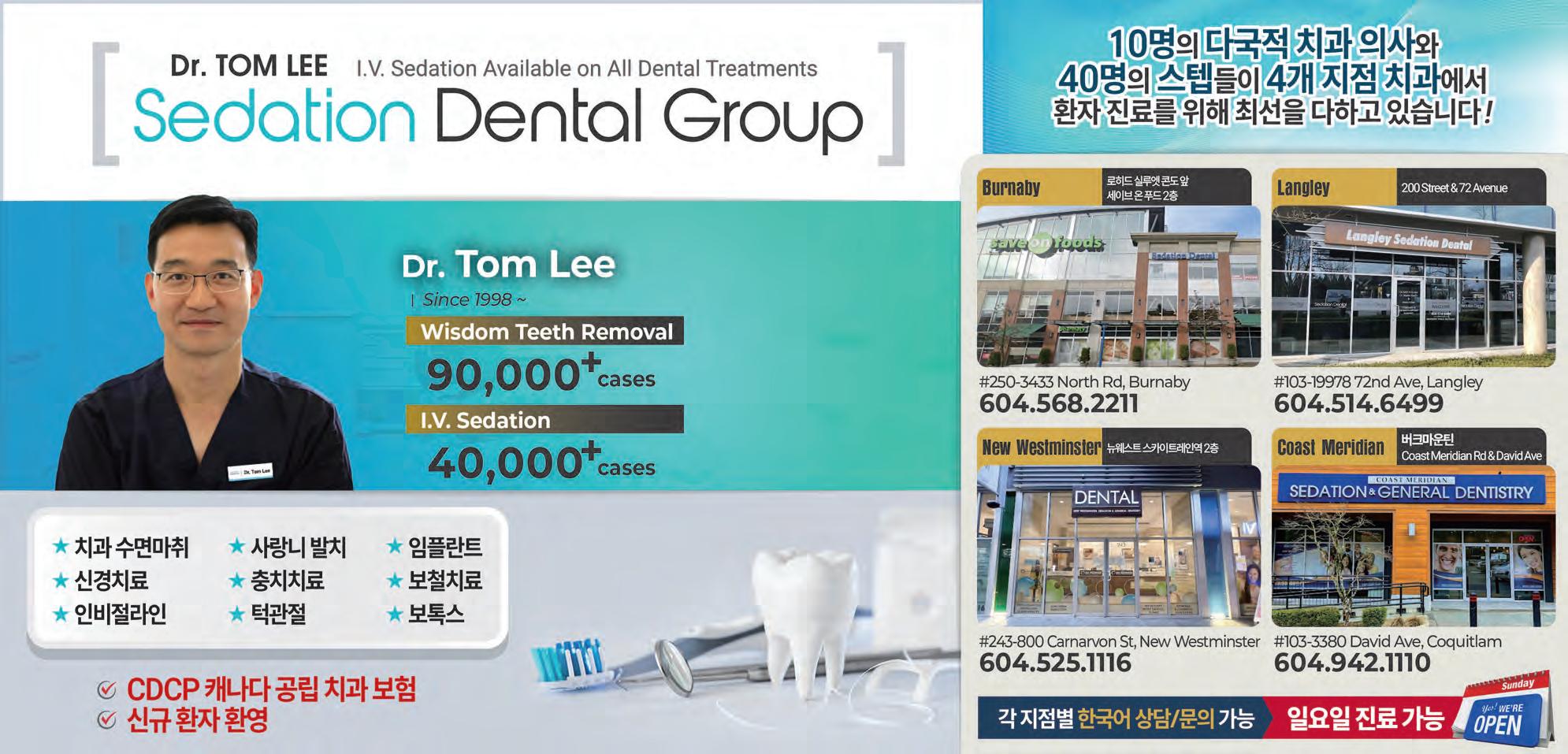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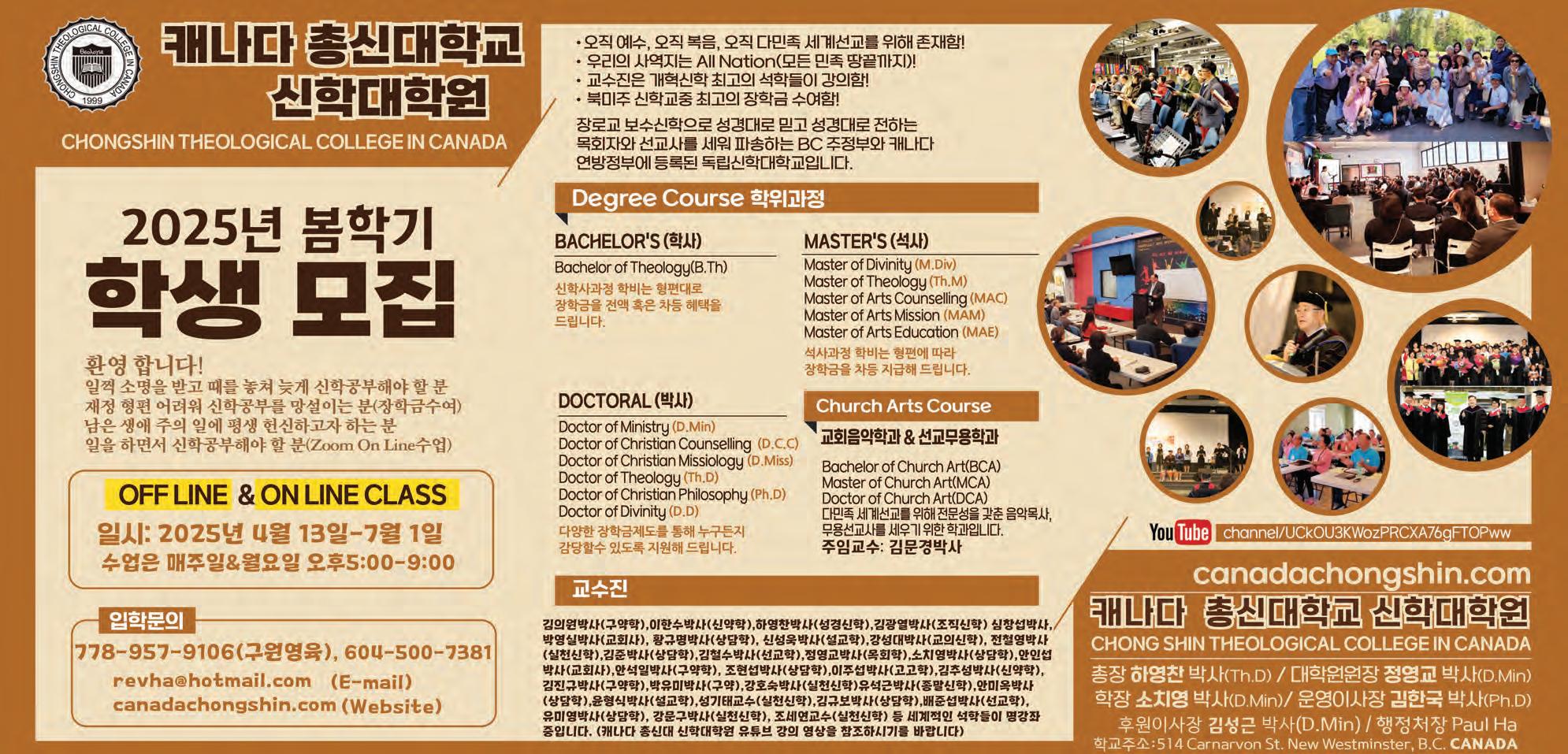

초등학교 시절, 방 두 칸에서 여덟 식구
가 살았다. 두 칸이라 해도 중간의 미닫이문
을 열어젖히면 방은 하나가 되었다. 방 모퉁
이에 둥근 양은 밥상을 펴놓고 숙제를 했다.
그때마다 어린 동생들이 달려와 밥상 다리
를 잡아당기거나 밥상을 뒤집었다. 앉은뱅
이 책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했다. 그것은 가구보다 공간에 대한 갈망
이었다.
가정을 이루고도 한참 동안 나만의 방을
갖지 못했다. 그래도 늘 무언가를 썼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게 편했다. 식구들이 잠든 시
간에 식탁에 앉아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날
이 밝아왔다. 친정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에는 엄마가 잠든 후 환자 휴게실에서 글을
쓴 적도 있다.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는
장소 같은 게 문제되지 않았다.
지금 나의 글방은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37층에 있다. 책상을 벽에 붙
이지 않고 방 가운데에 놓았다. 어느 벽에도
기대지 않은 책상은 자유로워 보인다.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배, 출어를 끝내고 돌
아와서 쉬는 배,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 어구
를 챙기는 배 등, 나의 책상에는 이런 배의
이미지가 있다.
하얀 캔버스 천에다 나의 수필 한 단락을
적은 액자가 한 쪽 벽에 걸려있다. 글에 대 한 의욕이 가라앉을 때 읽어보는 구절이다.
“인생이란 자동 점멸등과도 같은 것. 기다
렸다는 듯 반짝 불이 들어왔다 가도 몇 발자
국 옮기는 사이에 이내 불빛이 사라지고 만 다.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간도 그 자동 점멸등이 꺼지기 전까지다.” ( ‘다시 수
필이다’ 중 일부)
나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방의 불을
켠다. 그때마다 새벽 조업을 나가는 어선을
보게 된다. 근처 선착장에 옹기종기 모여 있
는 작은 어선들 중의 하나다. 파도가 있는 날
은 배에 매단 외등이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외등이 거의 직선을
그으며 간다. 나는 그 배가 외항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본다. 산다는 건 참으
로 엄숙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창가 아래에는 화분을 나란히 놓아두었
다. 레인보우, 오렌지 쟈스민, 산세베리아, 관음죽 식물은 하루도 자라기를 멈추지 않 는다. 주인이 눈길을 주든 안 주든 저 혼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어제는 방에 들
어서는데 그윽한 향기가 확 풍겨왔다. 키 작
은 오렌지 쟈스민이 아기 주먹만 한 꽃다발
을 세 개나 매달고 있었다. 식물의 이런 성실 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책상 위 가운데 자리에는 ‘원고 제출 계획
표’가 놓여있다. 수필 잡지 이름과 원고 마
감일을 날짜 순서대로 적어둔 것이다. 글을
쓰고 싶어서 쓸 때도 있지만 마감일에 쫓기 며 쓸 때가 많다. 나의 글 상당수가 이런 강 박증의 결과물이다. 그래서일까. 글을 잘 쓰
않은 작품을 여러 편 갖고 있는 수필가 가 더 부럽다. 내 삶의 두

아버지는 곰이었다 크고 무겁고 투박한 손
덩치 큰 몸으로 세상을 밀어내며
배운 것 없이 억울하게
가난과 맞서 싸운 사람
세상에 얻어맞은 마음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풀어내고
그 포효를 힘없이 받아내던 아이는
어느새 엄마가 되었다
곰의 얼굴을 하고
곰의 눈빛을 품고
곰의 고집을 안고
곰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아버지를 미워한 죄일까
아버지를 미워한 벌일까
그를 닮은 아이를
맘껏 미워할 수가 없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점점 더 미련해지는 아기 곰을 견디며
착은 그대로다. 그런데 애달프게도 좋아하 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별개다. 나에게 수필 은 여전히 ‘사용설명서가 없는 전자제품이 다. 이것저것 눌러보며 여전히 사용법을 알
아가는 중이다.
글을 잘 쓰려면 우선 섬세하게 느낄 수 있
어야 하고, 그 느낌을 나만의 표현으로 옮기 되, 공감이 가도록 써야 한다. 그런데 정작
글을 쓸 때는 이런 다짐을 한 쪽으로 밀쳐
둔 채, 되는대로 쓰고 있으니 그게 문제다. 그래도 희망적인 생각 하나를 떠올려본 다. ‘오늘 몇 줄이라도 쓴다면 내일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도 꾸역꾸역 쓰고 있다.
늙은 곰의 쓸쓸한 뒷모습을
아득히 떠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