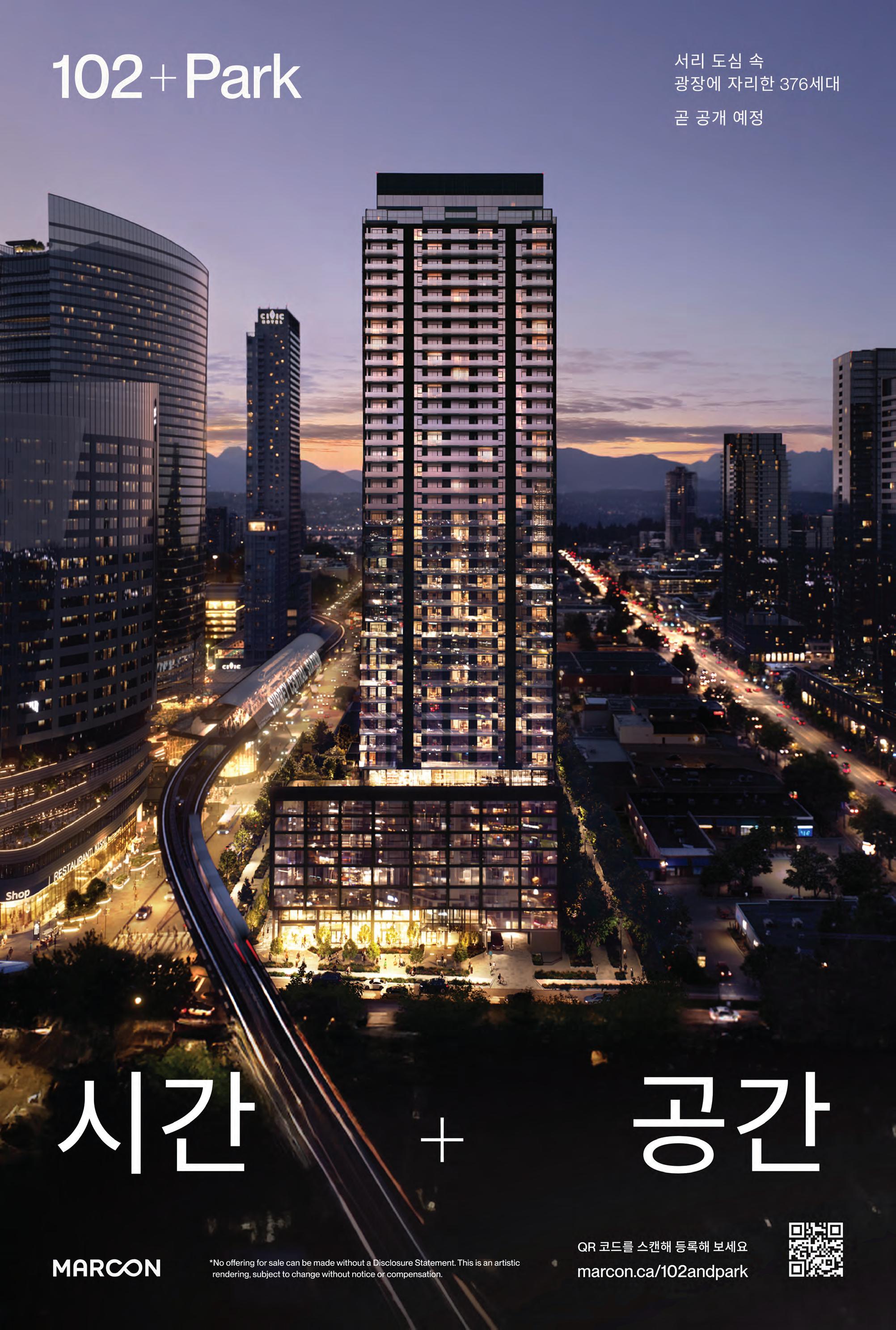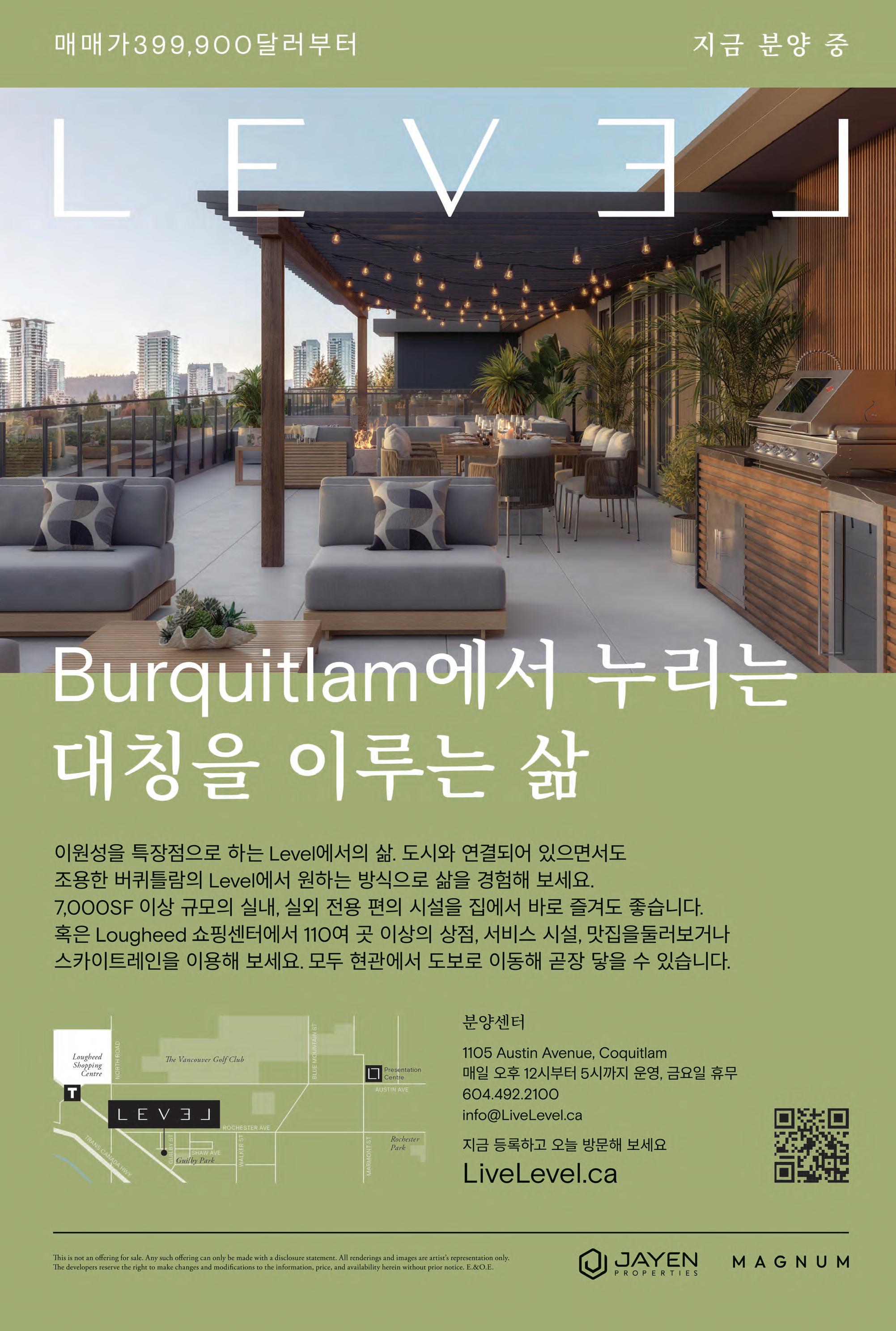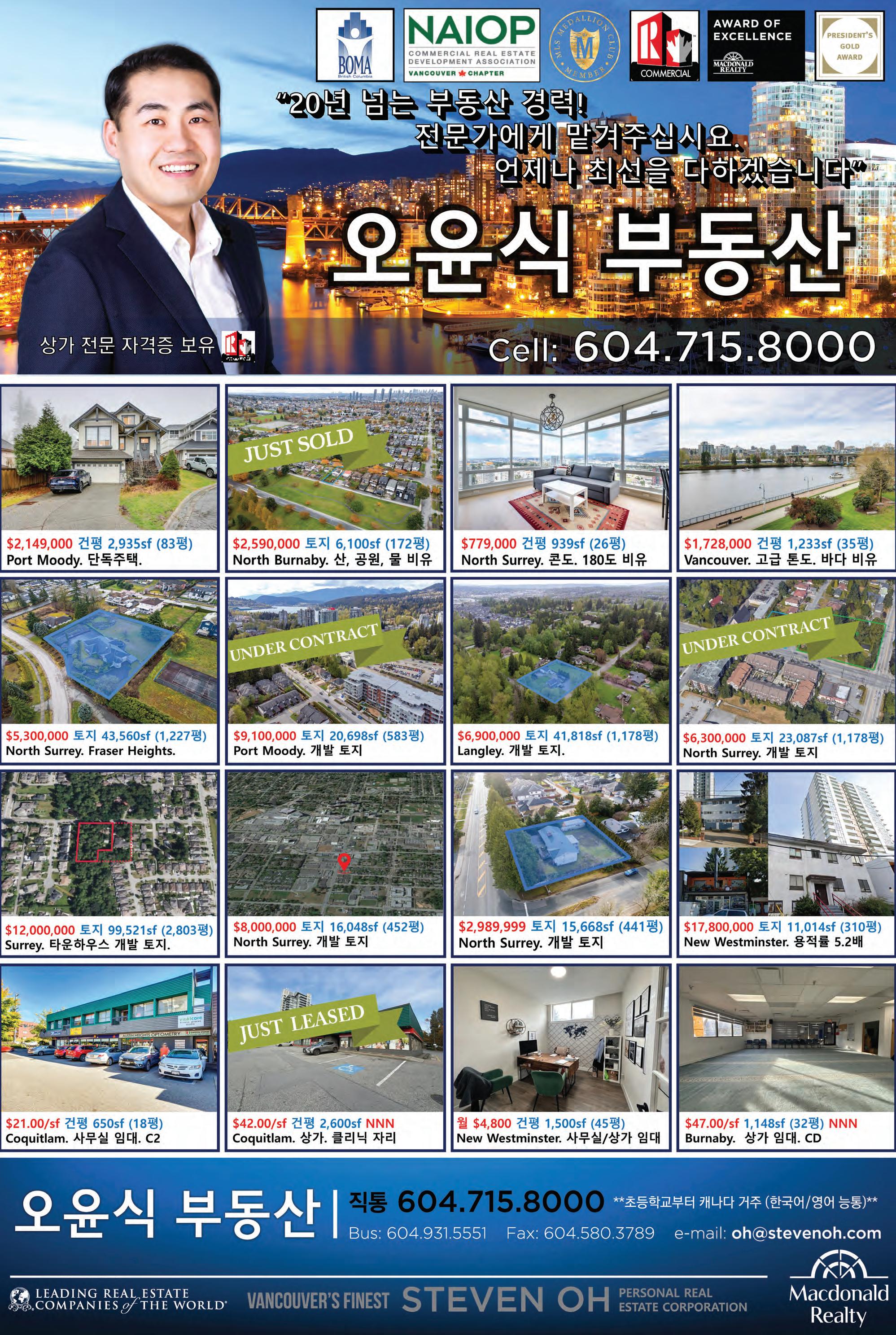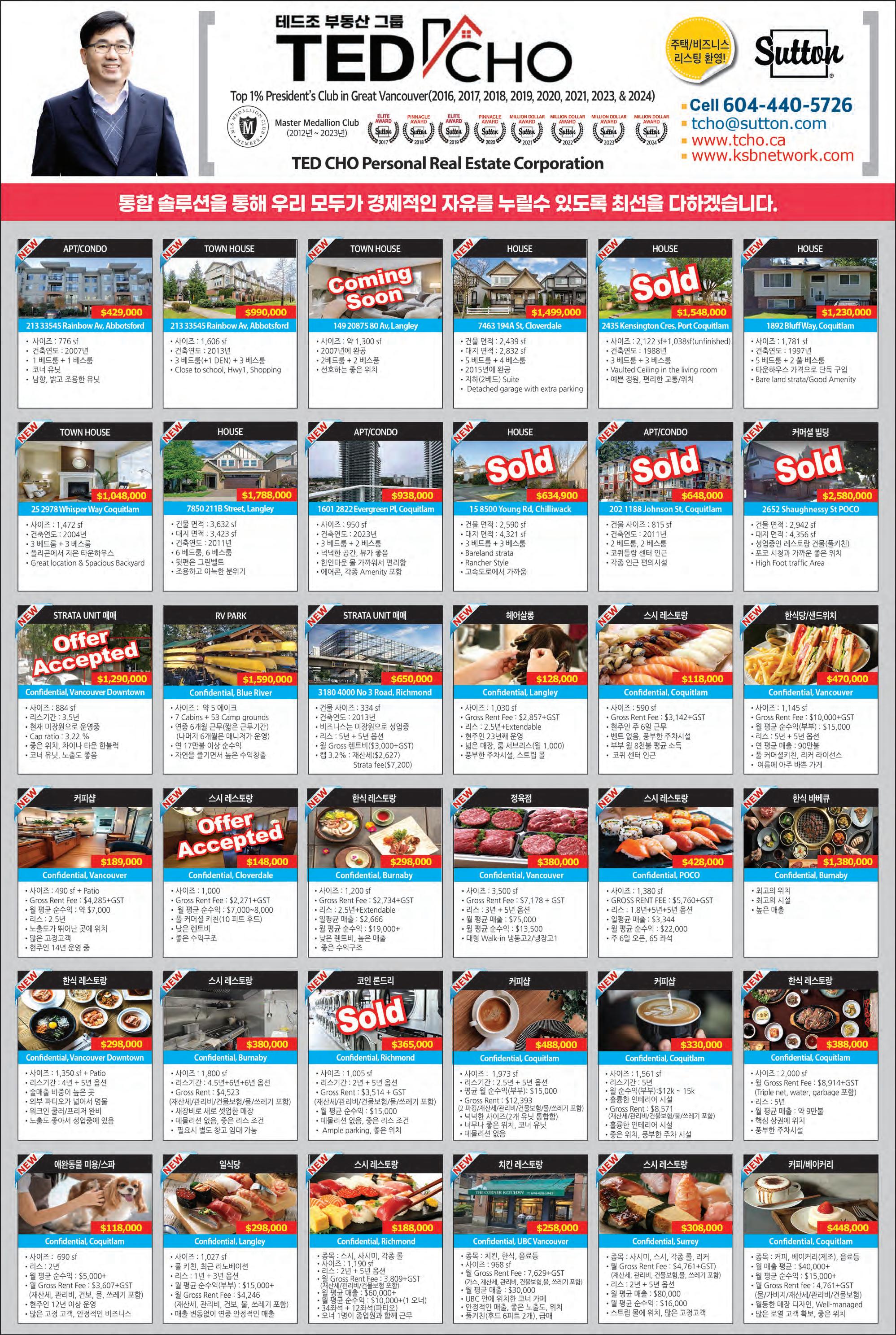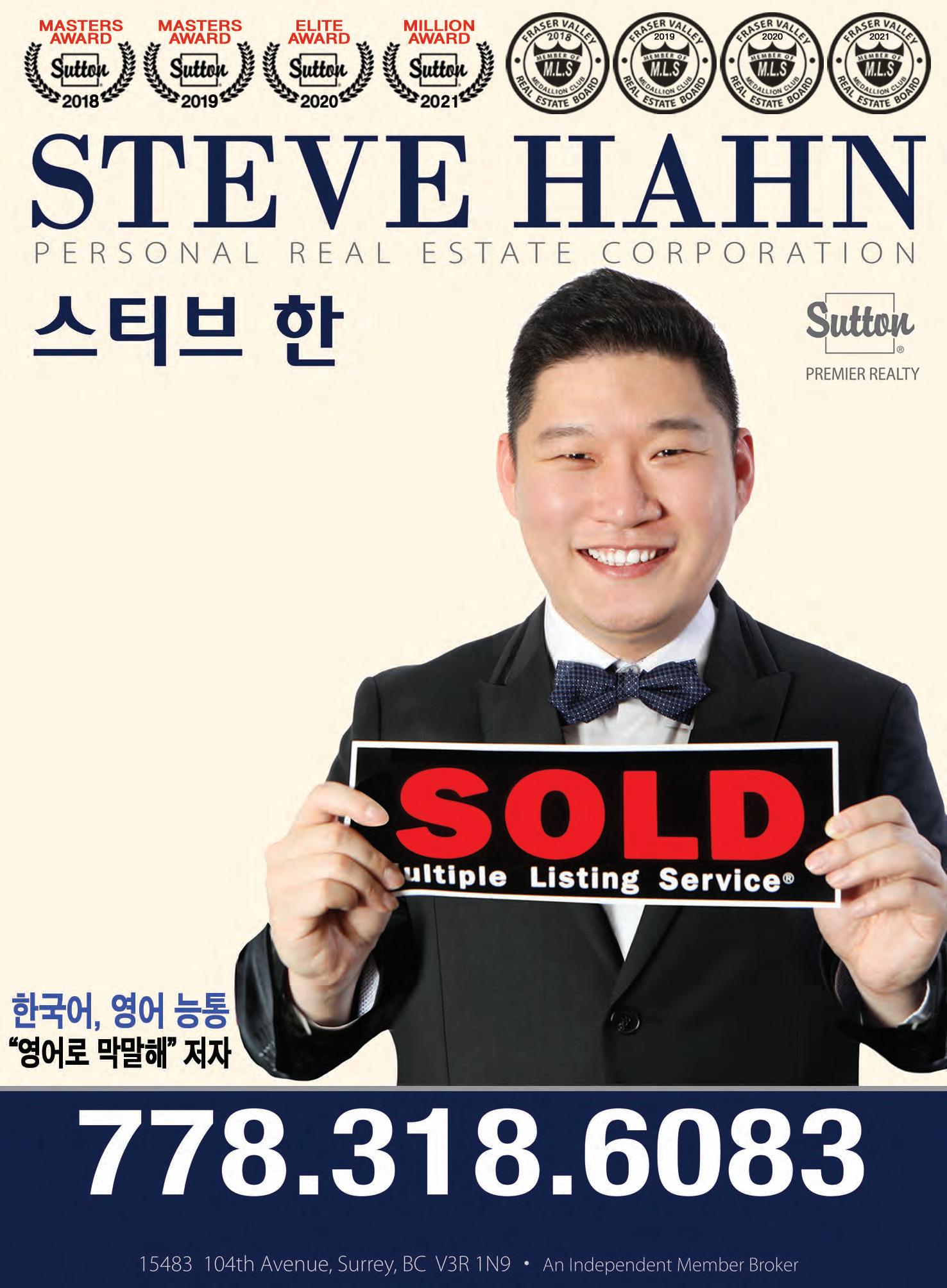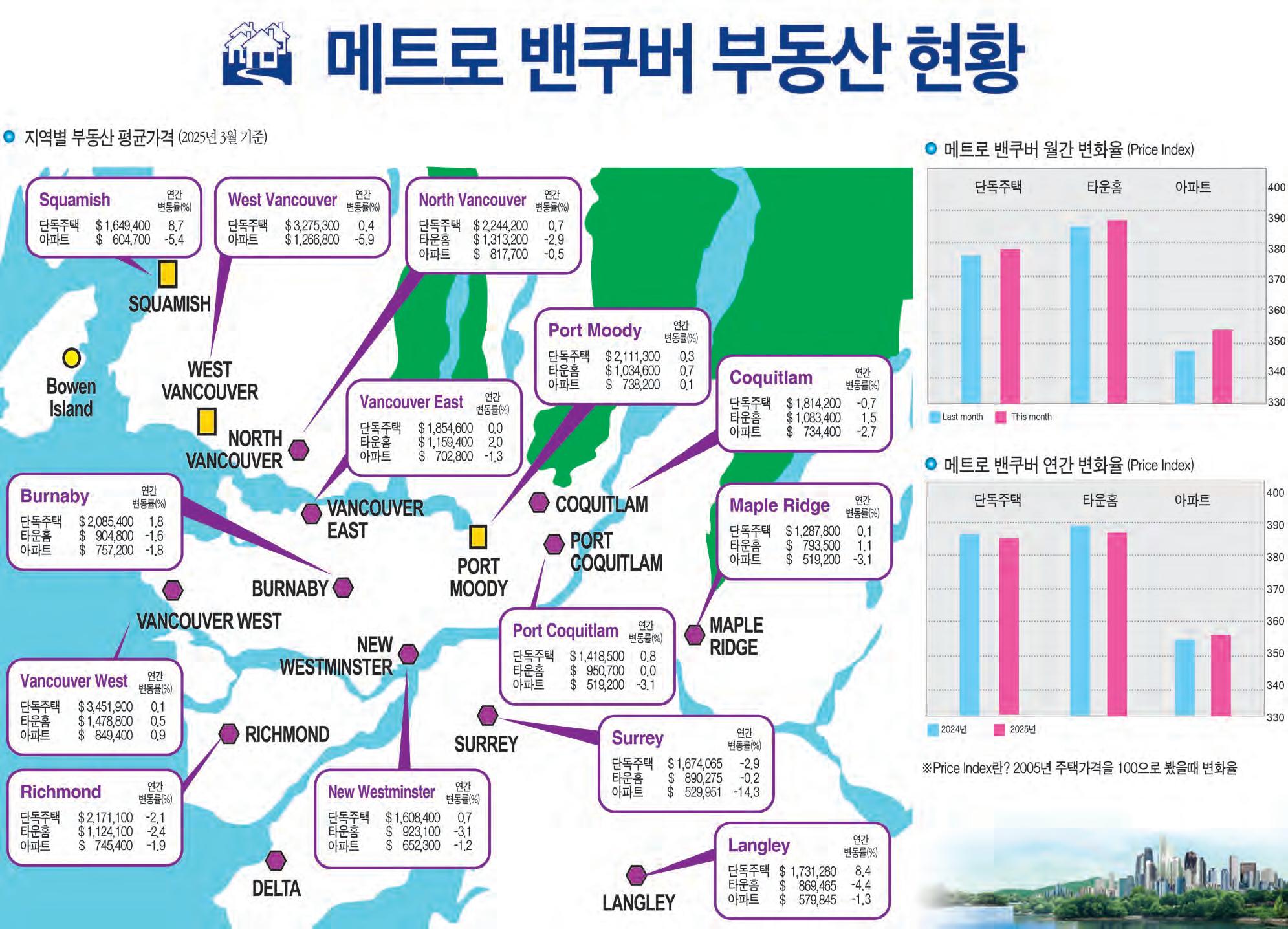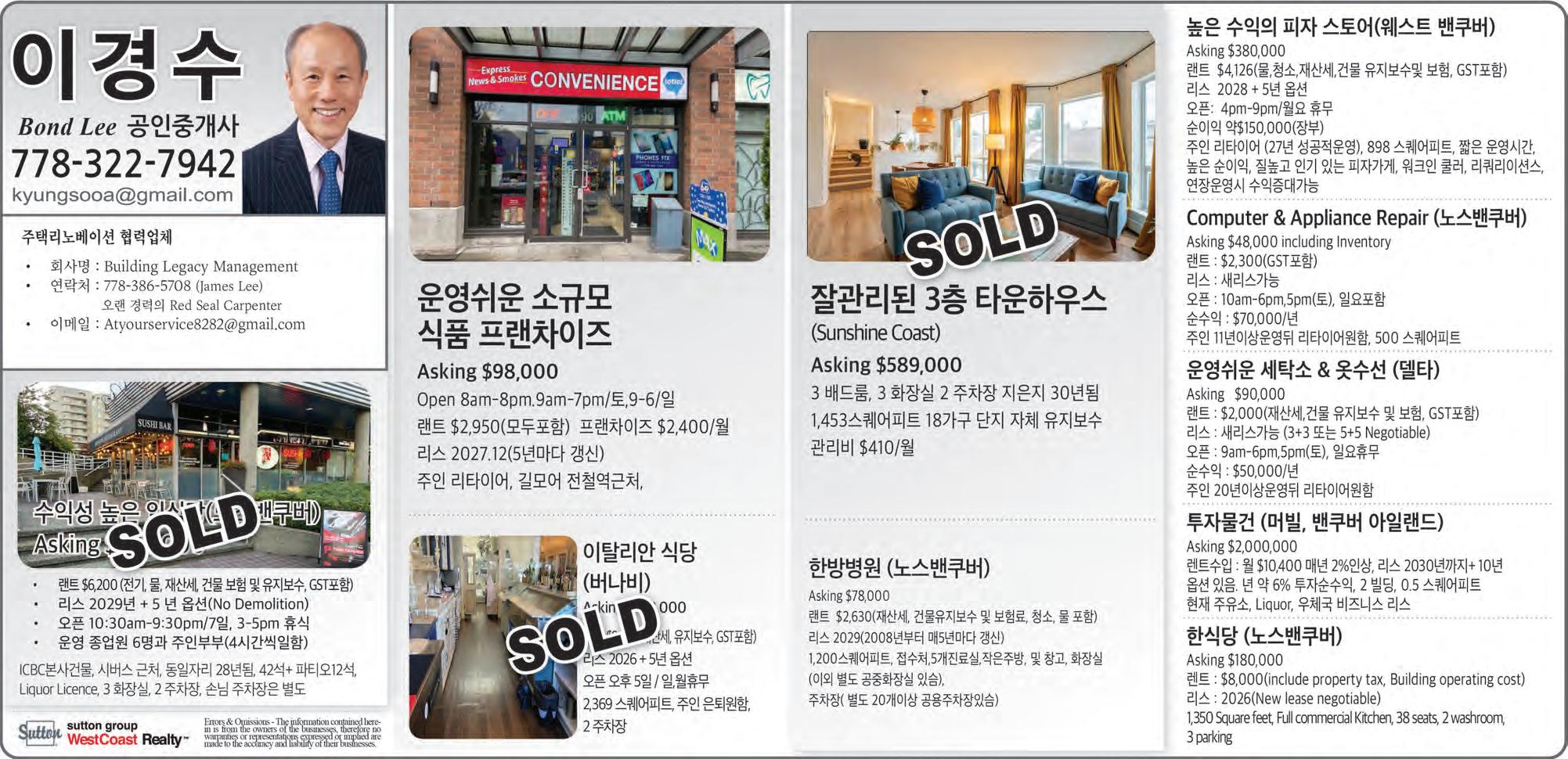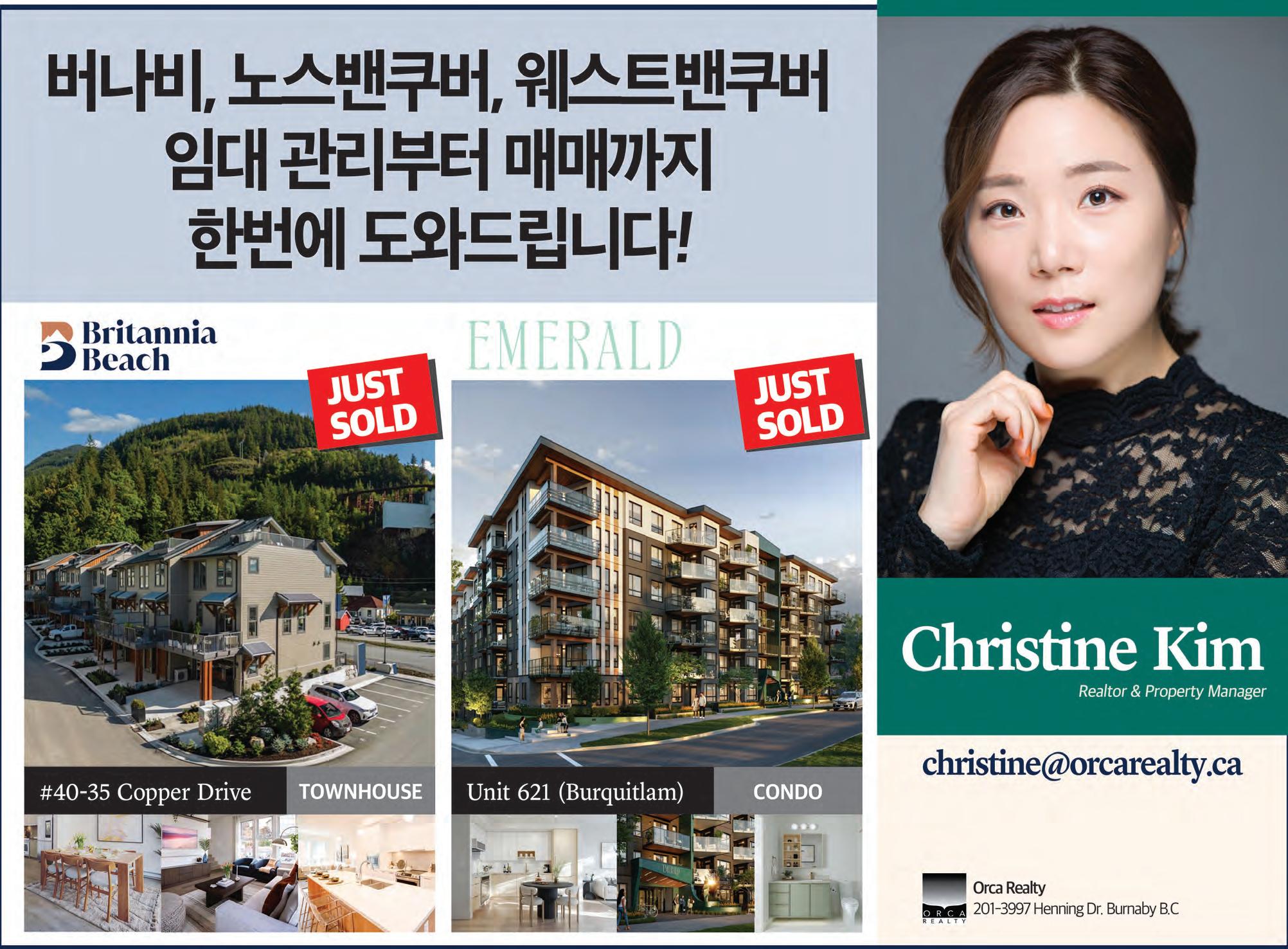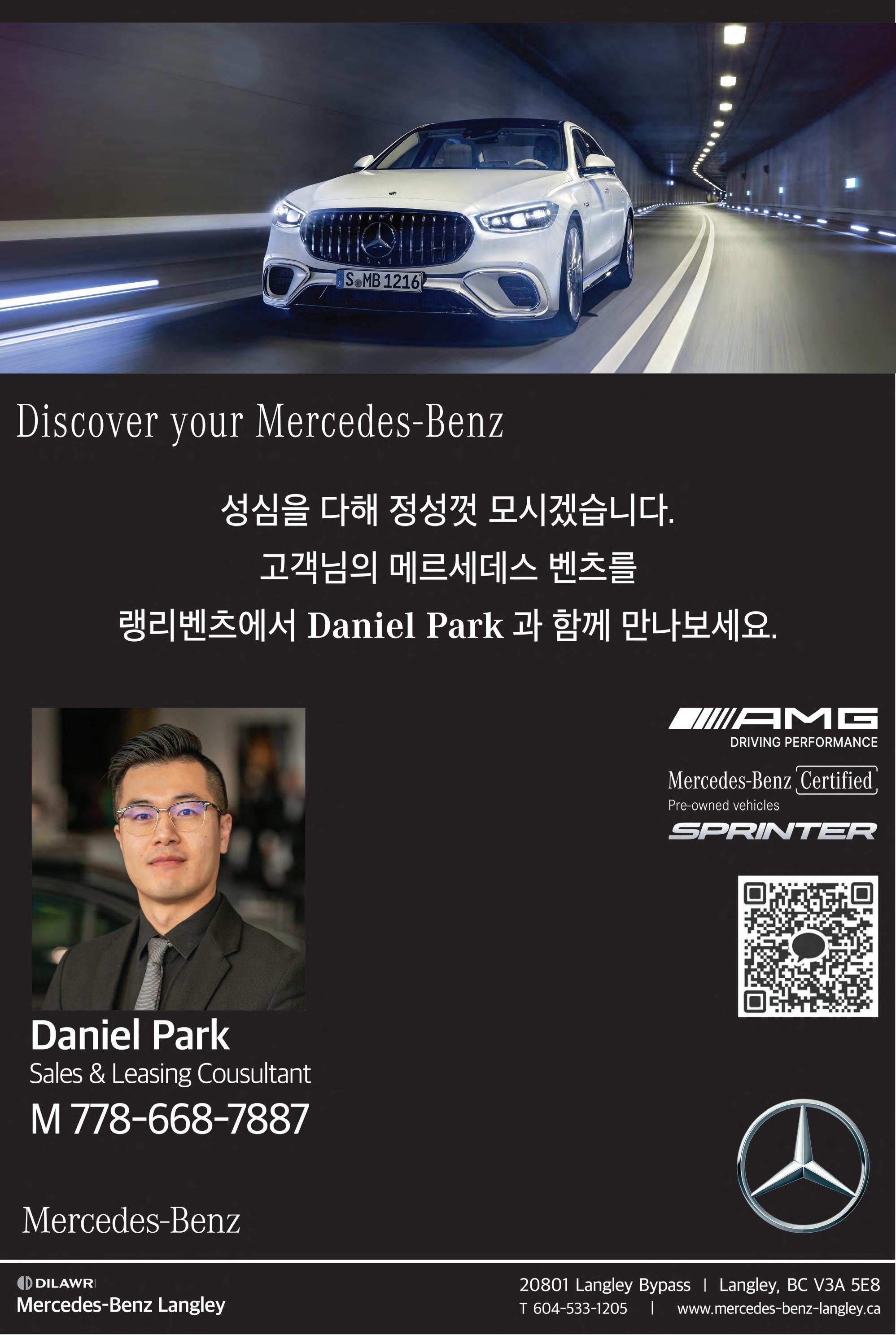서녘 하늘에 별이 돋는다. 마음이 잔잔해
야 보이는 초저녁별, 실눈을 뜨고 별 속에 아
는 얼굴이 있나 찾아본다.
지난겨울에는 눈이 자주 많이 내렸다. 눈
이 내릴 때마다 우리나라 문화계의 큰 별들
이 떨어졌다. 미당 선생이 떠나시고 얼마 후,
온종일 눈이 내리던 날 정채봉 선생이 눈 나
라로 가셨다. 이어 운보 선생도 떠나셨다. 그
뒤로는 겨우내 하늘이 낮게 내려앉으면 또
누가 떠나실라 겁이 났다.
이윽고 건너다본 커다란 눈, 그 웃음 뒤에
끝 모를 서러움이 배어나는 것 같아서 가슴
이 서늘했다. 어찌 보면 늘 배고픈 아이 같
고 또 달리는 지구에 내려온 어린 왕자 같
던 사람.
선생의 글을 처음 대한 것은 현대문학지 에 연재했던 《초승달과 밤》이다. 성장소
설이라 하고 성인동화 라고도 한 글은 신선
한 표현과 등장인물들의 착함에 다음 호가
기다려질 정도로 흡인력이 있었다. 그 후로
는 선생의 작품집을 구하는 대로 읽으면서
감동적인 글 뒤에 감동적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오늘 저녁을 농막에서 보내며 별들
을 만나려고 한다. 선생께서는 별이 되셨는
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해질녘을 좋아하
는 스님을 찾아갔다가 찬물이나 한 바가지
떠 마시라는 말씀에 찬물을 받쳐 든 바가지
에 별 하나가 돋았더라나. 그래서 천천히 버들잎인 양 별을 불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이다. 별을 불면서 물을 마
시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 뒤로 간혹
마음이 허할 때면 가슴에 별 하나가 떠오른
다는 것이다.
선생께서 민방위 야간 훈련을 나간 날, “
불을 끄시오, 불을 끄시오.”외치고 다니다 보 니 순식간에 하늘의 별들이 또록 또록 해졌
다. 그때 “별님 들도 불을 끄시오.”하고서 혼 자 웃었다는 분, 하늘 마음이 아니고는 볼 수 도 느낄 수도 없는 글을 읽으며 내가 선생을
두고 어린 왕자를 생각하는 연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짧은 만남이지만 글에서 만난 사람과 현 실에서 만난 사람이 한결같은 느낌을 주어 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만남 뒤에는 행
복했고 용기가 솟았으며 여운이 오래 갔다.
사람들이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기에
신이 타인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고 서 로 비춰보며 좋게 살라 하신지도 모른다.
선생의 글 속에 자신을 두고 “비겁자, 나 태한, 이중성, 가련한.”이라고 표현한 구절 이 나온다.
이러한 쓰라린 어둔 밤을 거쳐 하늘 마음 을 찾은 것은 아닐지. 누가 나에게 당신의 뒷 모습은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가만히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뒷모습은 아
앞모습이 만들어낸다는

<星>
산그늘 아래 조가비 같은 오두막 한 채
저녁 밥물 끓는 소리 도랑물처럼 흐르고
굴뚝 연기 아스라이 어스름을 몰고 오는데
박꽃처럼 허리 휜 어머니가
정짓간 문턱을 넘나듭니다
사립문을 건너온 초저녁 별들이
초롱불처럼 처마 끝에 깃을 내리면
비탈 밭에서 달빛을 지고 돌아오시는 아버지, 실루엣 같이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도
달빛처럼 환해집니다
아이들 글 읽는 소리마저 아득히 사라지고 고요가 홀로 내려앉아 졸고 있는 집,
곤한 어머니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하현달을 밀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