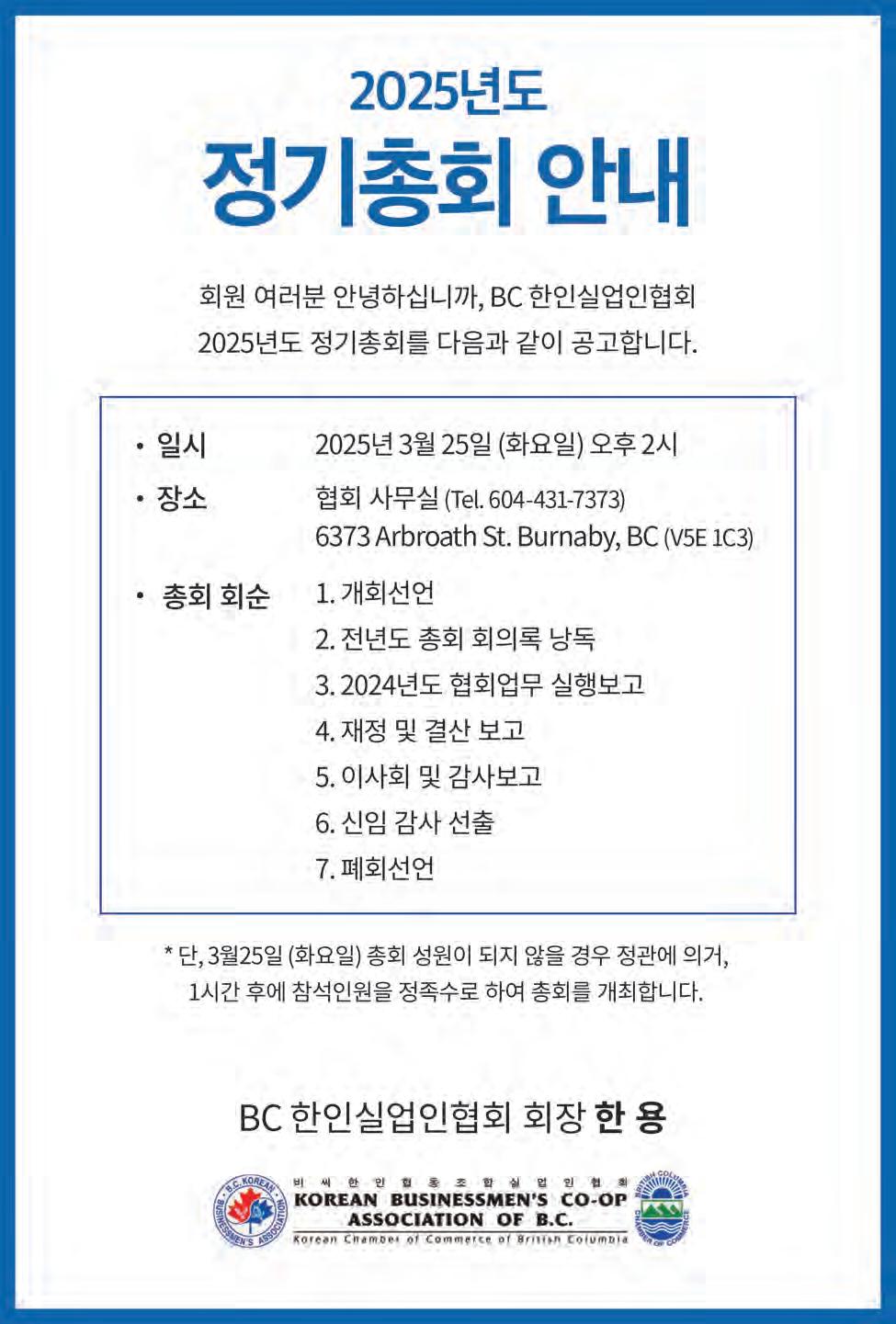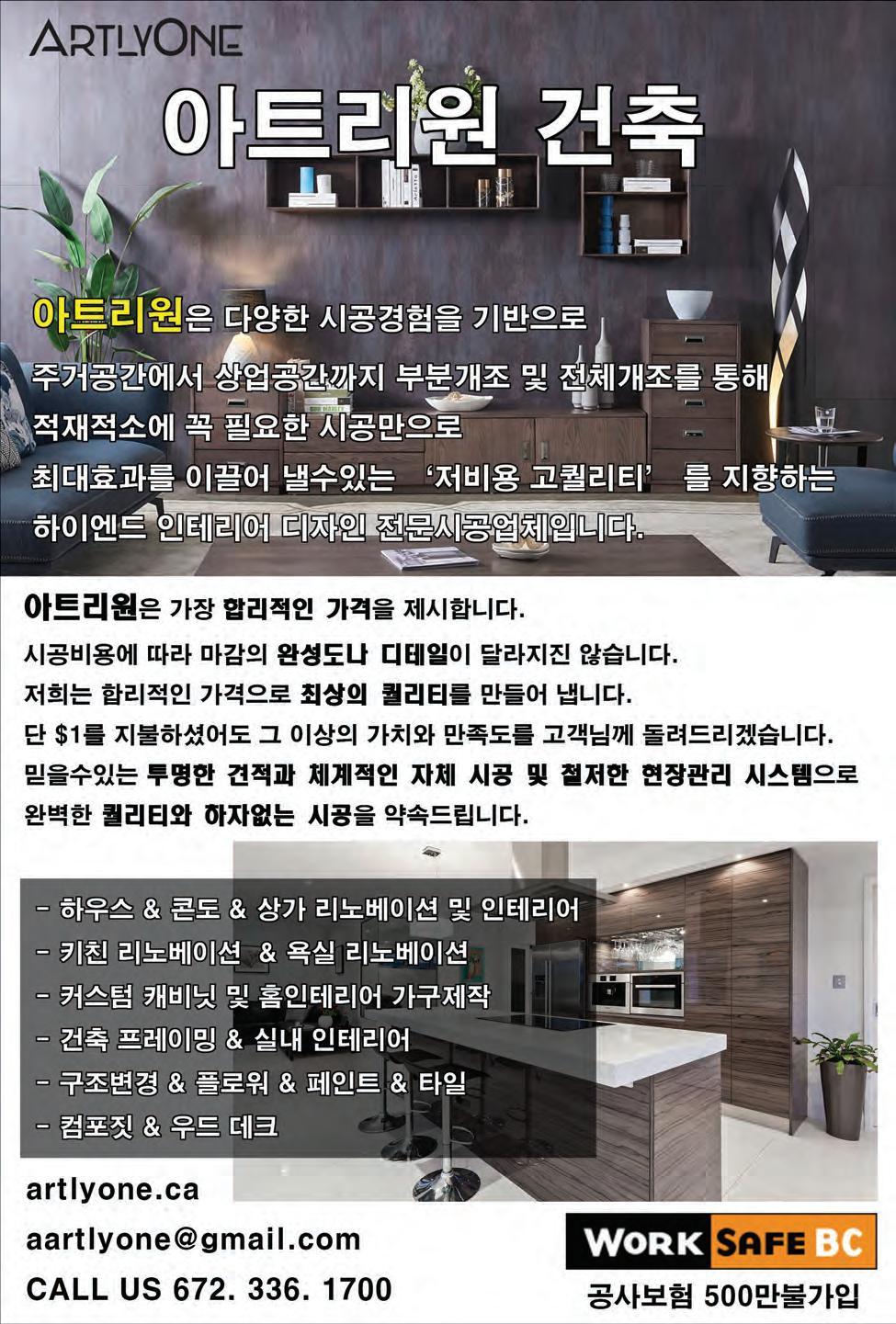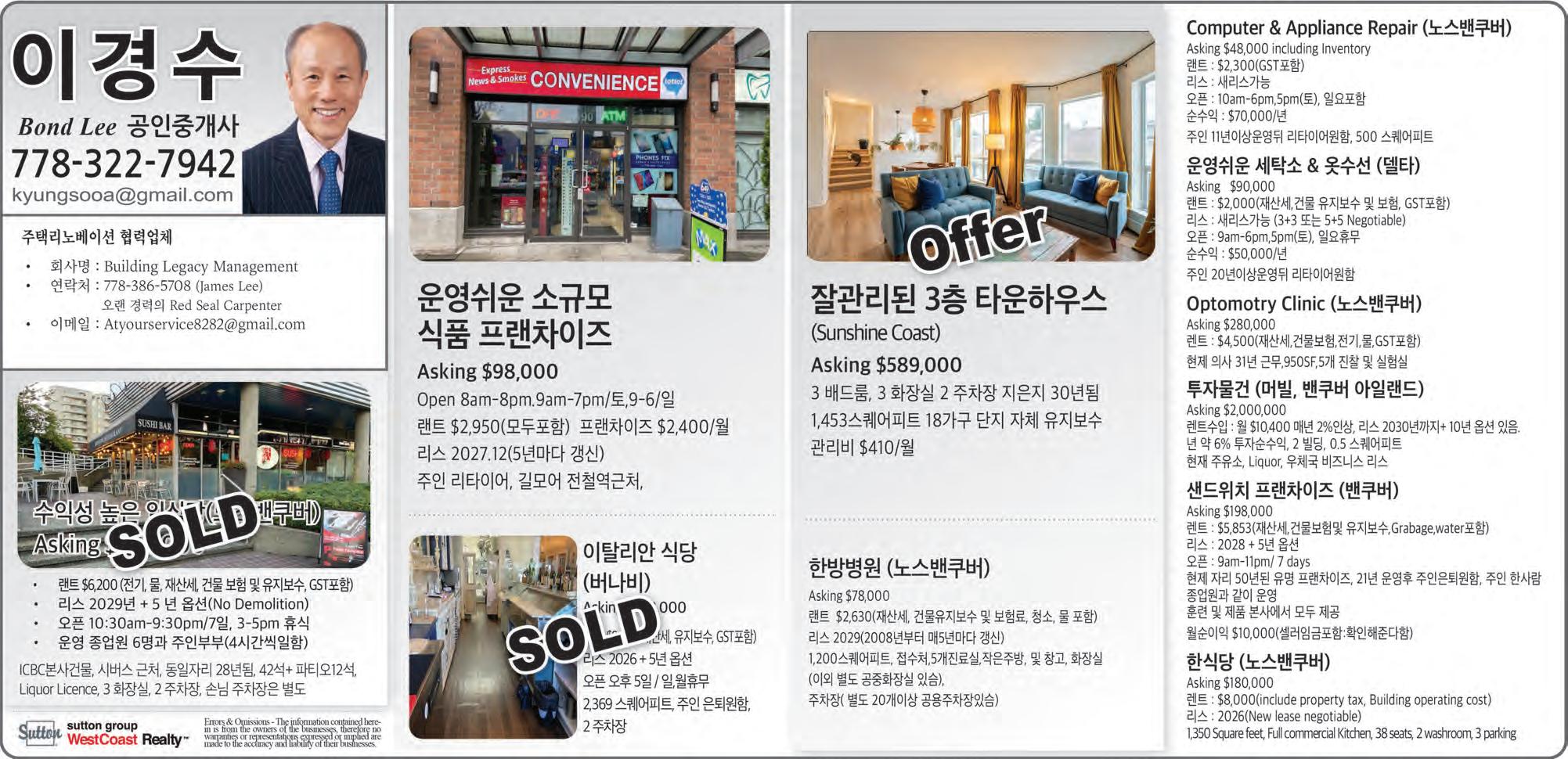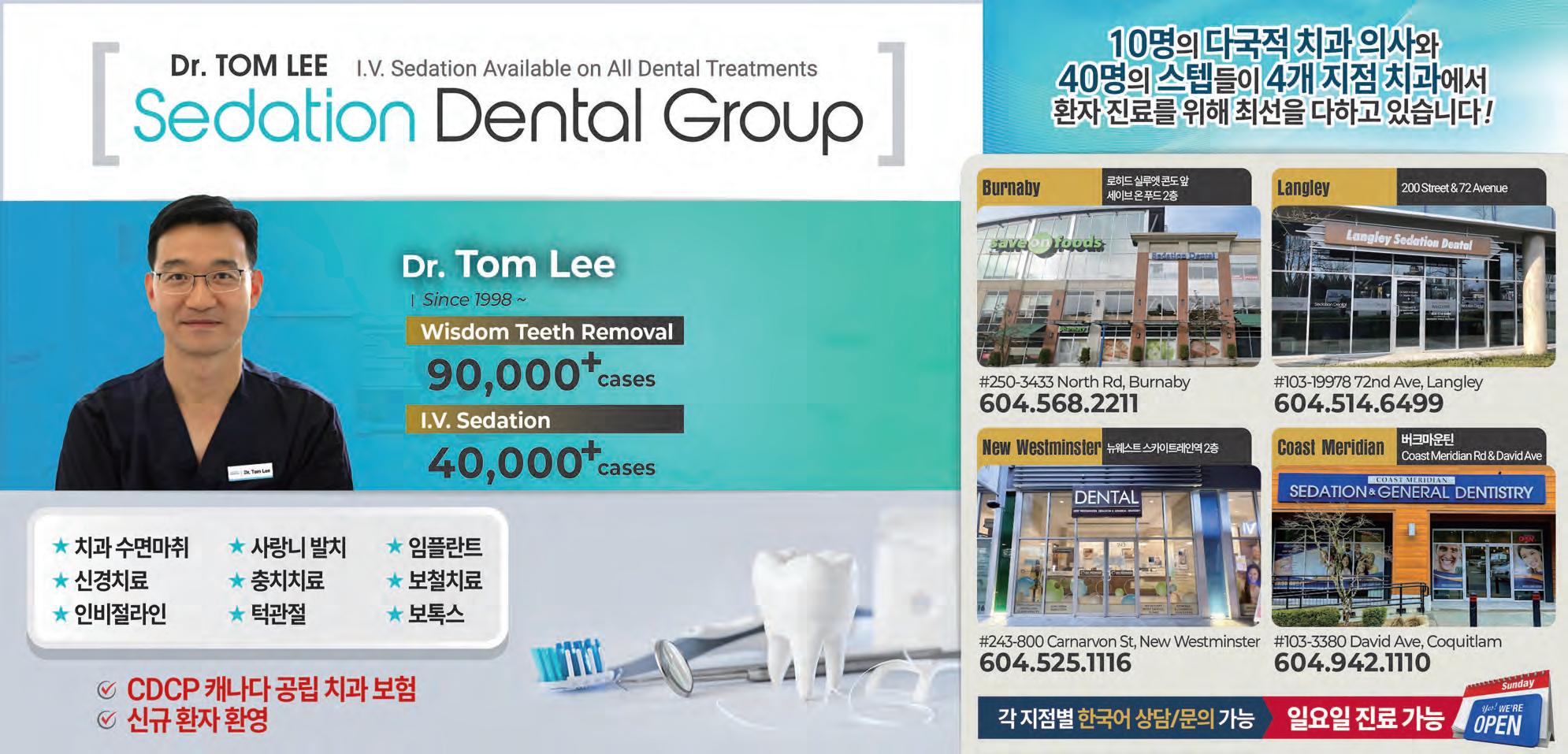



어렴풋한 어릴 적 기억 속 아우의 조그마
한 얼굴이 보인다. 너무 허약한 체질이어서
나이가 들도록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채 간
신히 기어 다니기만 하였다. 한참 후 동네 어
른들의 훈수에 따라 개울을 뒤져 개구리를 잡
아 구워 주었는데 특효약이 되었는지 걷기 시
작하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며 형편과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살갑지 못한 형이었다. 캐나
다에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과자를 유난히
좋아하던 50이 넘은 아우에게 과자 사 먹으
라 내민 지폐를 받으며 멋쩍게 웃고 있었다.
“언니 눈에는 내가 아직도 어린애이지?” “응.
너 좋아하는 초콜릿과 리즈 크래커 사 먹어.”
우리는 어려서도 무척 이질적 기질이었다.
내성적인 형은 속내를 별로 내주지 않았고 예
술가적 기질이 풍부한 아우는 늘 삶과 고약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기 자리를 지켜
내려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도저히 인내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외줄타기 하며
끊임없이 운명에 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화폭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궁색하
게 캔버스를 마련하여 그림을 그리며 현란한 색채의 환영과 풍부한 이상을 쏟아 내고 있었
다. 그것은 때로는 하늘과 땅으로, 가상 시조 새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하지 못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어 영롱한 색으로 엮어졌다가 섞
이기도 하며 화폭 속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
로 뿜어내고 있었다.
후드득, 똑 똑 양철지붕을 두드리며 떨어지
는 빗소리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아우에게 주
어진 마지막 날은 하늘이 높고 햇볕이 따뜻하 게 내리쬐는 봄날이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
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황급
한 걸음을 재촉하였다. 문득 치오르듯 엉켜버
린 슬픔을 목구멍으로 삼켜 보낸다.
그림을 놓는 날이 죽음이라 말할 때 난 도
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애처로운 동
생의 곤두박질친 삶이 미워질 뿐이었다. 마지
막까지 새로운 작품 구상으로 설레며

새 생명 같았던 나의 봄
먼 길을 돌아오다
어쩌면 길을 잃어버린 걸까
기다림의 세월1년
설렘으로 보낸 또 다른 1년
그리고 다시 인고의 시간 1년
이제나 저제나
그 지난한 세월 속에서
애가 닳고 닮아
가슴엔 재만 남을 지경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
몸이 부자연스럽다는 것
참 험난한 길이다
그래도 애써 쓴웃음으로
세월에 묻어야 한다는 마음에

난 점점 안절부절이다
봄이 오면 좋아질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기다림
하얀 목련이 다시 필 때면
부디
따뜻한 나의 봄도 다시 오기를